[어른의 그림책] #5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것들에 대하여

저는 시골 가는 게 싫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우리 엄마의 고향은 경북 영주. 엄마는 결혼하며 대도시로 삶의 터전을 옮겼지만, 외할머니는 평생을 그 곳에서 사셨죠.
거기에 사는 어르신들은 자기 마을을 "금가이" 라고 불렀습니다. 금강리를 어른들은 그렇게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외할머니를 뵙는 건 너무너무 좋았지만, 시골엔 불편한 것 투성이였어요.
영주 시내에서도 한참을 들어가야 하는 깡촌이었으니 말이죠. 제대로 된 슈퍼마켓도 하나 없었어요. 과자를 먹고 싶어서 외할머니에게서 받은 용돈을 손에 꼭 쥐고 점빵(점방)에 가면 과자도 몇 개 없는, 정말 그런 시골이었어요. 마당엔 풀도 없고 진흙이 깔려 있어서, 비라도 올라치면 발이 푹푹 빠지는, 정말 그런 곳이었으니까요.
우리 자매와 비슷한 또래의 형제가 그 동네에 있어서 우리는 발가벗고 냇가에서 개헤엄을 치기도 했었지요.
물이 너무 맑고 깊었어요. 제가 그때 한 열 살 무렵이었을까요. 점점 몸에도 사춘기 티가 나면서 부끄러워서 더 이상은 발가벗고 냇가에서 헤엄을 칠 일은 없었어요. 냇가가 점점 얕아지고, 공사 때문에 크레인이 와 있는 건 보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골에 올 때마다 마을은 점점 변해 갔습니다.
굴삭기와 기중기가 점점 많아졌고, 산은 나무가 베이고, 돌만 가득했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지는 건 느꼈지만, 어차피 그건 어른들의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외할머니의 마을에 현수막이 붙기 시작하더군요.
무분별한 공사를 중단하라.
"엄마, 저게 무슨 소리야?"
"여기 영주댐 건설된다. 마을이 사라지는 거지."
그때서야 모든 퍼즐이 맞아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엄마의 고향이자, 외할머니의 평생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많이 들어봤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였어요. 마을이 통째로 깊은 물 속에 빠집니다. 영원히 가 볼 수도 없게 말이죠.
엄마랑 차를 몰고 마지막으로 금강2리에 갔었을 때, 그때서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쓰라림을 느꼈습니다.
몇 억 정도의 보상비를 받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뿔뿔히 흩어졌습니다.
엄마는 고향이 없는 사람이 되었고, 외할머니는 영주 시내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시고 있습니다. 안락하고, 편안하게요.
그래도 물에 잠긴 고향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겠지요.
생각하면 다시금 가슴이 쓰라려 옵니다.

사라져 가는 공간들, 밀려나는 사람들.
제 이야기와 꼭 닮은 그림책이 있어서 눈물이 왈칵 날 만큼 반가웠습니다.
<안녕, 우리들의 집> (김한울 글, 그림)입니다.

화가 김한울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사라지는 집들을 눈여겨보며
'자라나는 집'과 '일구어진 땅' 이라는 전시를 열었고, 그 이야기를 담았다가 그림책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이 작품입니다.
함께 잠시 들여다 볼까요?

"사람들은 떠나고 집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것들도 남았습니다.
낡은 책장, 고장 난 선풍기, 줄이 끊어진 기타,
팔이 뜯어진 곰 인형, 그리고 마당의 꽃나무와"
사람들이 떠나고 난 뒤의 공간은 참 황폐합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자목련은 더욱 화려하기만 하네요. 담쟁이 덩굴도 더욱 번성하고요.
팔이 뜯어진 곰인형도 어린 아이에게 안겨 잠을 청하던 때가 있었을 텐데요.

"개도 있습니다.
집에 홀로 남겨진 개는 주인 냄새가 밴 물건과
함께 지냈습니다. 낮에는 동네를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녔지만, 해 질 무렵에는 늘 제자리로
돌아와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 산불이 크게 났을 때 버려진 동물들 이야기에 눈물 흘렸던 분들이 많으실 테지요.
알아서 살 길 찾아 가면 좋을 테지만, 개들은 그러지 못하고 주인을 기다리며 그 곳을 맴돈다고 해요.
이 장면에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혼난 건 저 뿐만은 아닐 거예요.

"부서진 가구와 깨진 유리, 뜯어진 문짝과
장판으로 엉망진창이 된 집에는
고양이들이 남았습니다. 좁고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고양이들에겐 여전히 아늑한
보금자리였으니까요."
주인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개들과는 달리,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생겨
활개를 치는 고양이들도 있습니다.
이 공간을 지켰던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새들은 전과 다름없이 날아와 수다를
떨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꽃은 피고,
나무는 푸르게 우거지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게 되자 동네는 더욱 초록으로 우거졌지요.
차라리 이대로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 다음은 어떤 슬픈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사람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지만,
밀려난 사람들이 보이는 듯한 그림책, <안녕, 우리들의 집> 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사람도 밀려나지만, 동물은 어떨까요?
두 번째 그림을 함께 보고 읽어 보겠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창작 그림책이네요.
<지혜로운 멧돼지가 되기 위한 지침서> (권정민 글, 그림)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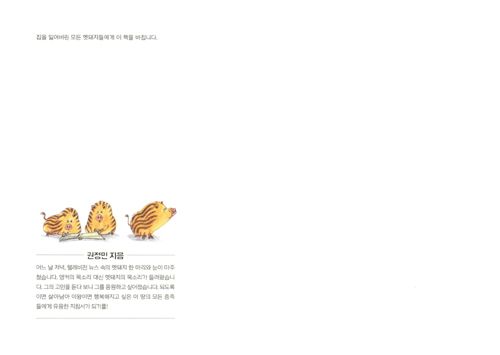
작가는 어느 날 텔레비전 뉴스에서 멧돼지 한 마리와 눈을 마주쳤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는 앵커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그 멧돼지만 생각났다는군요.
그렇게 탄생한 그림책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하루아침에 집이 없어져도 당황하지 말고 새 집을 찾아 나설 것."
거두절미하고 첫번째 지침을 단호하게 내미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 멧돼지들은 허겁지겁 달려오는 엄마 멧돼지만 바라봅니다.
공사가 한창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죠?

"힘들면 쉬어 갈 것"
두 번째 지침입니다.
평화롭고 마음이 푸근해지는 지침이다 싶은데, 그림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 지는군요.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것에 감사할 것."
작년 가을, 대전동물원에서 퓨마 한 마리가 탈출했다가 사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퓨마의 고향은 어디였을까요? 문이 열려서 나갔을 뿐인데, 그 일로 퓨마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야 좋았던 것일까요.

엄마 멧돼지는 아기 멧돼지와 간신히 도로를 가르질렀습니다.
다행입니다- 라고 말하는 찰나 철창에 가득 실린 돼지 수백 마리가 보입니다.
이쯤 되면 뭐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16개의 단호하고 현명한 지침을 다 따르고, 우리는 그림책을 덮기 전에 면지를 읽게 됩니다.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침을 다 읽고, 다 지켰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림책을 활짝 펼쳐 양쪽 면지를 함께 보면 가슴은 더욱 착잡해 집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또 인간이 아닌 존재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살고 있는 것일까요.

브라질 국립박물관이 모조리 타서 소장품 90%가 타 버렸을 때,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이 불에 탔을 때,
숭례문이 불에 타는 걸 지켜보고 있었을 때
우리가 느꼈던 감정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낱말이나 문장은 없었을 겁니다.
공간은, 때론 누군가에겐 존재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어떤 공간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